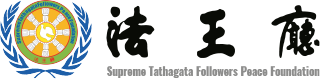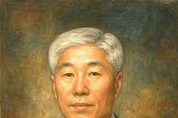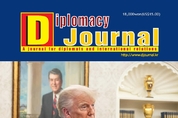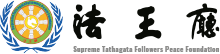-

총무원장 일정스님의 “대원본존大願本尊”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 이 한마디 서원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먼저 오르고자 하는 이가 많고, 먼저 구원받고자 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은 가장 늦게 성불하겠다고, 가장 아픈 이들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중생이 모두 구제되기 전에는 혼자 편안해지지 않겠다는 대원大願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지장대원본존地藏大願本尊이라 부릅니다. "대원"이란 무엇인가? 대원大願이란 큰 기도이며, 큰 책임이며, 큰 자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소원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맹세입니다. 지장보살의 대원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가장 외로운 이, 가장 죄 많은 이, 가장 미움받는 이 곁에 머무는 실천입니다. "지옥의 문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 자, 지옥의 불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는 자 그가 바로 대원본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원을 세우며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봅니다. “나는 어떤 원願을 품고 살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속의 이익이나
- 이정하 기자
- 2025-07-28 05:11
-

사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국회 김교흥 문체위원장 예방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25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김교흥 신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의 예방을 받고, 전통사찰의 보존지 지목 현실화와 선명상 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예방 자리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법오스님, 사서실장 일감스님을 비롯해 천우정 국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국회 직원불교신도회 회장), 이유주 문체위 행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진우스님은 김 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하며 문체위원장 취임을 축하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부족하지만 과분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고 답했다. 진우스님은 먼저 ‘전통사찰 보존지 지목 현실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통사찰의 상당수가 종교용지가 아닌 임야, 전답, 대지, 도로 등으로 잘못 분류돼 있어, 전통문화의 보존은 물론 불사(佛事) 추진에도 행정적 제약이 따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지적 기록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사찰 본연의 공간조차 종교용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통사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지목의 정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진우스님은 지난
- 이준석 기자
- 2025-07-26 08: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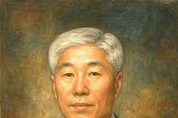
사회 [담화총사 칼럼] 한미 ‘2+2 협상’ 전격 취소… 단순 일정 문제인가, 균열의 전조인가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한미 양국 간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체인 ‘2+2 협상’이 돌연 취소되면서 외교가와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무역장관,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의 ‘일정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내외 관측통들은 이번 취소가 단순한 스케줄 조정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미 양국이 최근 무역과 안보를 축으로 복합적 이슈를 조율하는 가운데, 이번 협상이 중요한 정치적 조율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협상이 불발된 것은 일종의 외교적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이 한미 간 주요 회의를 일괄적으로 취소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 회피 또는 정책적 불만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대중 전략의 온도 차,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에 대한 한국의 중립적 입장 등에 점차 복합적인 불만을 축적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 유예 또는 재협상을 주요 안건으로 설정하고 있었던 만큼, 회담 불발은 전략적
- 이정하 기자
- 2025-07-26 07:34
-

생활 복사꽃 아래 사슴이 머문 순간...K-민화로 피어난 평화의 서사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K-민화 전문 작가 담화총사의 신작 『복사꽃 미소에 머문 사슴』이 한국 전통 민화의 길상적 상징과 현대적 감수성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작품은 복숭아꽃(복사꽃), 연꽃, 사슴 등 민화 속 대표적인 길상 소재를 통해 복福과 수壽, 평화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한다. 담화총사는 이를 전통적인 소재 해석에 머물지 않고, 신화적 서사와 정적인 자연의 순간을 결합해 감성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림에 담긴 이야기는 ‘신과 인간의 경계가 열려 있던 아득한 옛 시절’에서 출발한다. 영원의 숲을 떠난 사슴 한 쌍이 인간 세상의 끝자락에 이르렀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연꽃이 피어나는 고요한 연못가다. 그곳에서 복사꽃은 마치 미소 짓듯 활짝 피고, 붉은 해가 떠오르며, 자연은 한순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장면은 단지 시적인 풍경이 아닌,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상향의 형상화다. 하늘에서는 물새가 내려와 노닐고, 모란과 국화, 파초와 조롱박까지 온갖 길상 식물들이 만개한 이 정원은 자연과 인간, 신과 생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다. 작품 속 사슴은 그 가운데 조용히 서서 관람자에게 속삭이듯 말한다. “여기가 바로 복과 수,
- 이정하 기자
- 2025-07-28 05: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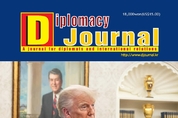
포토 외교저널 영문판 7월호 JPG전체보기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외교저널 영문판 7월호 JPG전체보기
- 이정하 기자
- 2025-07-30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