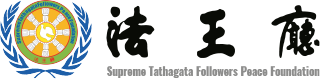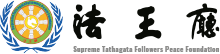-

인물 천공스승의 통찰,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 파병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은 의미 없이 발생하지 않으며, 북한의 현재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인류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현재 북한은 생존을 위해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어떤 선택이라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러시아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가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비난하거나 북한의 선택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과거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약소국이던 시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월남 전쟁에 참여했다. 월남 전쟁은 한국의 전쟁이 아니었지만, 국제적 관계와 생존의 필요 속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북한 역시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선택은 그
- 이정하 기자
- 2024-11-21 11:40
-

인물 올림픽 유도 레전드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제14대 이사장에 선임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1984년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 유도의 전설로 불리는 하형주(62)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제14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회의실에서 하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하 이사장은 올림피언 출신으로는 최초로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그의 임기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2027년 11월 17일까지 3년간이다. 12일 취임식을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하 이사장은 체육계와 경영,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그는 1988년 서울올림픽의 유산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이끌며 스포츠 복지 증진과 체육산업 육성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해나갈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한국 유도의 전설, 하형주 경남 진주 출신인 하형주는 부산체고와 동아대를 졸업하고, 1984년 LA 올림픽 남자 유도 95kg 이하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유도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에도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여러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유도의 위상을 세계에
- 이정하 기자
- 2024-11-19 16:38
-

인물 일정스님의 “아상我相에 대하여”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아상我相"에 대한 법문은 불교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가르침과 관련이 있다. "아상"은 말 그대로 '나'라는 생각, 즉 자아의 실재성에 대한 집착을 의미한다. 이를 내려놓음으로써 참된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이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이다. 우리는 누구나 '나'라는 존재가 실재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며, 그 모든 것들이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나'라는 생각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집착일 뿐이다. 아상이란 무엇입니까? '아상'은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다.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그에 따라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 '아상'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며,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 내가 손해를 보거나 무시당할 때 분노하고, 내가 얻는 것이 있을 때 기뻐하며, 항상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된다. 하지만 이는 참된 자아가 아니라, 환상 속에서 생긴 집착일 뿐이다. 자아의 실재성은 허망한 것 부처님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다. '나'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닌, 인연에 의
- 이정하 기자
- 2024-10-18 11:48
-

인물 일정스님의 “사무량심四無量心과 자비희사慈悲喜捨”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사무량심四無量心과 자비희사慈悲喜捨에 대한 법문은 불교의 핵심 수행 중 하나로, 모든 중생을 향한 자애와 연민, 기쁨, 그리고 평정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무량심이란 네 가지 한계 없는 마음을 의미하며, 그 마음은 자慈, 비悲, 희喜, 사捨로 나누어 집니다. 1. 자慈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 ‘자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선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비의 마음은 친한 사람뿐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자애를 통해 자신과 타인 간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하는 대자대비심을 기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2. 비悲 고통받는 존재에 대한 연민 ‘비悲’는 고통받는 존재를 향한 연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중생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비’의 본질입니다. 비의 마음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3. 희喜 타인의 행
- 이정하 기자
- 2024-10-07 11:18
-

인물 일정스님의 “교시불어敎是佛語”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교시불어敎是佛語는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를 넘어, 중생을 깨우치고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 법문에서는 부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게 하고, 어리석음과 무명을 걷어내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중생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으며,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중생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시불어"는 바로 그 가르침이 우리가 따르고 실천해야 할 법임을 뜻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며, 세속적인 욕망과 번뇌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 이정하 기자
- 2024-09-27 08:42
-

인물 일정스님의 “화엄장華嚴藏”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오늘은 화엄장의 의미와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장華嚴藏'은 화엄경의 깊은 가르침을 모은 집합체로, 대승불교의 방대한 지혜와 자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緣起'의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이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연기緣起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화엄장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단순히 개별적인 존재들의 집합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깊이 연결된 하나의 큰 그물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존재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수한 인연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상호 의존성에 대한 깨달
- 이존영 기자
- 2024-09-26 10:49
-

인물 일정스님의 “물욕탐심物慾貪心”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물욕탐심物慾貪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재물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끝이 없으며, 결국 우리를 더 큰 괴로움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욕망이란 불을 붙이면 꺼지지 않는 불길과 같아서, 채우려 할수록 더욱더 큰 갈망을 낳게 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문을 통해 탐욕의 문제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물욕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법문 욕망은 본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물질에 대한 갈망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사라지고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마치 갈증이 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를 뿐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그 자체로 무상無常하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첫째, 욕망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망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재물과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채워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는 무관합니다. 그 욕망을 좇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허무와 불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무소유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소유할 것이
- 이정하 기자
- 2024-09-25 16:02
-

인물 일정스님의 “무명無明과 집착執着”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무명無明과 집착執着에 대한 법문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불교에서 무명과 집착은 중생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설명됩니다. 1. 무명無明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무명은 한자로 '밝지 않음'을 뜻하며, '어리석음' 또는 '무지'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명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즉, 존재의 참된 본질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생은 존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며, 이로 인해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무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진리입니다. 중생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며, 영원한 행복이나 안정성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하기에 그 기대는 결국 실망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무아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중생은 '나'라는 고정된 자아를 믿고 그것에 집착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며 독립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무명은 이런
- 이정하 기자
- 2024-09-24 11:30
-

인물 일정스님의 “무명無明”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중생들의 삶에 대한 법문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생은 윤회 속에서 고통받으며, 무명無明으로 인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생사生死를 반복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불교는 이러한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과 깨달음을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중생들의 삶에 대해 법문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주요 내용 입니다. 1. 고통과 윤회 중생의 삶은 고苦, 즉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설합니다. 이 고통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생로병사로 인해 느끼는 고통 -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고통 - 변화와 무상無常에서 오는 고통 중생은 무명을 통해 고통의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윤회의 고리를 반복하게 됩니다. 2. 무명과 집착 중생들은 사물의 실체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무명無明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명은 지혜가 결여된 상태로, 세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중생은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이를 통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3. 연기법과 무아 모든 현상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연기법緣起法이라고 합니다. 중
- 이정하 기자
- 2024-09-23 11:26
-

인사 · 동정 일정스님의 "단상斷常의 이견二見"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단상斷常의 이견二見은 불교에서 잘못된 두 가지 견해를 가리키며, '단斷'은 모든 존재가 한 번 사라지면 끝난다고 보는 견해이고, '상常'은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진리와는 멀리 떨어진 것으로, 불교에서는 중도를 통해 이 두 극단을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1. 단견斷見이란 무엇인가? 단견은 모든 것이 끝없이 소멸하며,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이 견해를 가진 사람은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사라짐을 두려워하거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여기며 삶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단견은 삶의 연속성과 인과를 부정하며, 윤회와 업보의 법칙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일어나고, 그 인연에 의해 다시 새로운 존재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번의 생을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상견(常見)이란 무엇인가? 상견은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를 지닌다고
- 이정하 기자
- 2024-09-10 16:47
-

인물 일정스님의 오늘의 법문
법왕청신문 이준석 기자 | 오늘 법문에서는 다음 구절을 중심으로 진정한 가치와 마음의 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일수심천재보 백년탐물일조진 앙부괴어천 부부작어인”“三日修心千載寶 百年貪物一朝塵 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 이 구절은 마음을 닦는 것의 소중함과 탐욕의 덧없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삼일 수심 천재 보(사흘 동안 마음을 닦는 것은 천지의 보물) 여기서 ‘삼일 수심’은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마음을 닦고 정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를 설명합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수련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마음의 정화: 사흘 동안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천지의 보물보다 귀중한 것이 됩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초석이 됩니다. 지속적인 노력: 단기간의 노력일지라도, 마음의 정화는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우리의 내면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백년 탐물 일조 진 (백년의 탐욕으로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뺏긴다) 반면
- 이준석 기자
- 2024-09-02 12:06
-

인물 일정스님의 "지도무난至道無難 이야기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지도무난"은 선종禪宗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로, 도道로 가는 길에는 난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육조 혜능 대사의 가르침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도를 깨닫는 것이 본질적으로 쉬운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는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본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한 마음가짐과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지도무난至道無難의 의미 지도至道: 최고의 도, 즉 깨달음이나 진리를 의미합니다. 무난無難: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최고의 도는 어렵지 않다"는 의미로, 도를 깨닫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와 접근 방식입니다. 철학적 배경 비분별지非分別智: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좋고 나쁨,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이원적 사고를 초월해야 합니다. 본래의 마음: 모든 사람은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깨달음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저 이를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즉각적인 깨달음: 선종에서는 오랜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간의 깨달음을 통해 도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
- 이정하 기자
- 2024-08-07 07:13
-

인물 일정스님의 “천고난만千苦難萬” 이야기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천고난만千苦難萬은 불교에서 인생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생의 본질적인 고통과 고난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고난만"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인생이 수많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깨달음과 자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법문을 통해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길을 찾아봅시다. 1. 인생의 고통과 고난 불교에서는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사성제四聖諦"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苦聖諦"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인생에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며, 싫어하는 것과 마주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 고통의 원인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집성제集聖諦"에서 설명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 이정하 기자
- 2024-08-06 09:11
-

인물 일정스님의 “두두물물頭頭物物” 이야기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두두물물은 중국 선종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이 곧 깨달음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모든 것에 진리가 깃들어 있음을 강조하며, 일상 속에서 불성을 깨닫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선禪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지 회장( 재단법인 법왕청평화재단 승정원장, 가피암 회주 일정 대종사) 두두물물頭頭物物의 의미 "두두물물"은 "머리마다, 물건마다"라는 뜻으로, 모든 것 하나하나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별한 어떤 것만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모든 현상과 사물에 진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두물물의 철학적 배경 일상 속의 깨달음이란 선종에서는 일상 속의 모든 경험과 사물이 곧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특별한 장소나 상황에서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임을 의미합니다. 불이법不二法이란 두두물물은 이원론적인 분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이법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이는 본질에서 모든 사물과 현상이 같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래불성本來
- 이정하 기자
- 2024-08-05 07:24
-

인물 일정스님의 “사량복탁思量卜度”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먼저 사량복탁思量卜度은 생각하고 판단하며 계산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으며, 불교에서는 이러한 사량심思量心을 넘어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가르칩니다. 이 법문에서는 사량복탁의 의미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기 오늘은 "사량복탁"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 상태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불교의 가르침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량복탁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계산하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며, 이는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 상태를 인식하고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사량복탁의 의미 사량복탁은 '생각하다'라는 뜻의 사량(思量)과 '계산하다'라는 뜻의 복탁(卜度)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계산하는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의 본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 사량복탁의 문제점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계산할 때,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
- 이존영 기자
- 2024-08-03 09:51